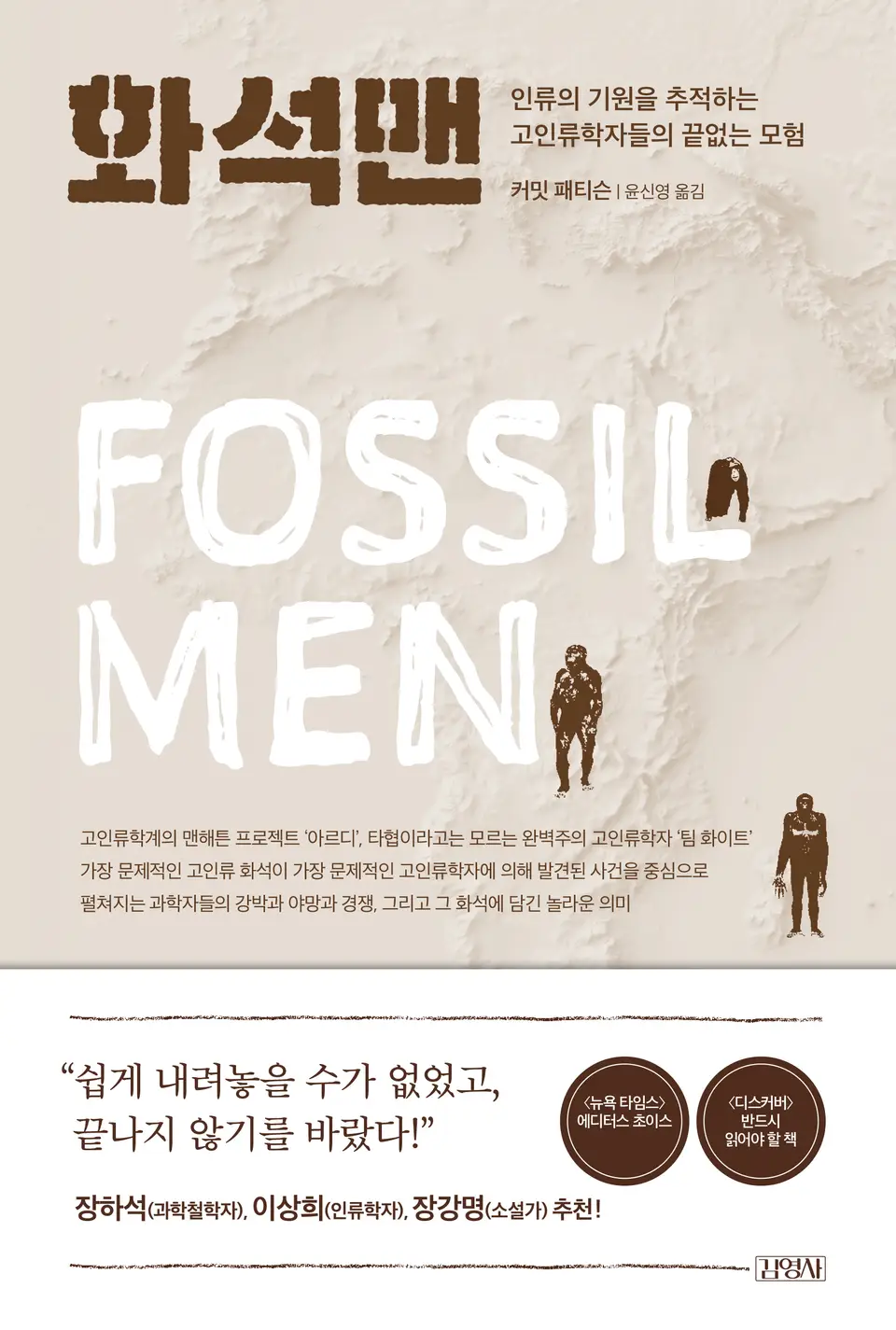
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는걸까? 이 두꺼운책을 읽는 내내 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다. 사실 이 책에 대해 알게된 것은 번역자인 윤신영 기자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 글을 보자마자 이건 질러야돼!를 외쳤던 것 같다. 최근에 고인류학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팀 화이트라니.. 그리고 이상희 선생님과 함께 쓴 《인류의 기원》을 통해서 윤신영 기자님의 진가를 알게 된 터라 더더욱 신뢰가 갔다. 직접 전자책이 출간되는지까지 확인한 이후, 출간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자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었다.
두께가 두꺼운 벽돌책이라고도 하고, 또 설마 너무 학술적이어서 (물론 관련영역이기에 읽어서 절대 손해될 건 없지만) 나의 취미로서의 독서와는 성격이 달라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게 왠 걸.. 여느 소설보다더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아니, 내가 발굴현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업계의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솔직히 한다리 건너면 아는 분들이 태반일 정도로 업계 분들인데.. 이걸 이렇게 재미있게 써내려갔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이야말로 저자의 필력이 엄청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매끄러운 번역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나도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장연구자와 이를 토대로 박물관이나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들 간의 갈등은, 형태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본다. 물론 고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여전히 현장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기에 존중받고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보면 그 안에서의 마찰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법. 여기에서 거의 주인공 급으로 등장하는 팀 화이트는 현장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데, 그의 성격과 말투까지 더해져서 갈등구조를 맥스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쓰니 마치 이게 소설같지만, 이 이야기는 논픽션이다. 팀 화이트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서술하다보니, 재미있는 상황들도 엿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유명한 리키패밀리를 서슴없이 까내리는 것들도 그러하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리 버거 교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날린다. 예전이 리 버거 교수의 《올모스트 휴먼》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지라, 이러한 부분도 참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다.
책을 읽는 도중에 선배와 잠깐 감상을 나누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발굴이야기, 학술조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있는 그러한 학사적인 사건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배경과 뒷이야기를 취재해서 엮어낸 책이기 때문이다. 단, 그 '엮음'이 매우 생생하고 스펙터클하게 잘 써낸 것이라는 것. 아마 학술세계에 이런 정치적이고, 유치하고, 얼렁뚱땅한 시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마 비전공자, 혹은 완전 다른 필드의 사람들도 참 재미있게 읽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정도 두께의 벽돌책이 이렇게 재미있기는 쉽지 않을거라는거. ㅎㅎ
여기서 잠깐. ‘꼴통’의 분류학을 소개하자. 팀 화이트의 분류에 따르면, 이 단어는 매우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호통치는 ‘저 꼴통!’은 적의 도덕적 또는 과학적 파산을 비난하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톤의 ‘너는 꼴통이야’는 화를 식히기 위해 쓴다. 사막의 땀처럼 금세 휘발되는 화다. 또한 빈정대는 식의 애정 표현일 수 있으며, 심지어 인색한 칭찬일 수도 있다. 이번이 그런 경우로, 화이트는 그 꼴통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고인류학에서, 발굴은 사람들이 그 단어에 품고 있는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절단면이 제곱미터로 측정되고, 작업이 여러 날 지연되면 인내심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점 정도만 대중의 인식과 비슷하다. 고대의 유물 및 유적을 보전하기 위해 발굴자는 그것이 나온 맥락을 파손해야 한다. 화이트는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 중 한 명의 말을 절대 잊지 않았다. “우리는 연구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 존재를 파괴한다.” 유일한 처방은 신중하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영원히 잃어버리기 전에 증거를 수집할 기회는 딱 한 번이다.
화이트는 그런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NSF가 대학원생 교육 프로그램에 쓸데없이 많은 돈을 쓰고 현장 연구에는 지원을 너무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00년에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야외에 나가 목숨을 걸고 화석을 발굴하죠. 연구실에 앉아만 있는 95퍼센트의 사람들이 그랜트 심사를 하는데 그들은 현장 연구를 몰라요. 하나만 알죠. 화석을 빨리 손에 넣을수록 거기서 분석적인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논문을 써서 커리어를 쌓겠죠. 그래서 화석을 발굴한 사람 손에서 화석을 뺏지 못해 안달이라고요.”
골반은 경쟁하는 요구들이 화해하는 해부학적 회합의 장이다.
또 아르디는 루시를 재조명했다. 더 본원적인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가 등장하자,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갑자기 훨씬 덜 유인원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침팬지와 고릴라로 이어지는 연결점 역할을 억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견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둘러싼 퍼즐 조각이 좀 더 맞춰졌다.
미들 아와시 팀은 현장 발굴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은 특이한 경우였다. 그해에 미국 형질인류학자협회 연례 총회에서 1000개 이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단 세 편만이 새로운 인류 조상 화석 발굴을 다루고 있었다. 형질인류학은 오래전 뼈를 바탕으로 세워진 분야지만 이제는 과거 발견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DNA를 연구하고 영장류 보행, 침팬지의 섹스나 공격 등 다른 분야로 관심을 넓혔다. 하지만 미들 아와시 팀에게는 현장 발굴이 여전히 최전선이었다. 오래전 뼈가 쓸모없어지는 때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었다.
'♡공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Books > Book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나다 도요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2) | 2023.03.16 |
|---|---|
| 임선우 『유령의 마음으로』 (0) | 2023.03.16 |
| 손정승 『아무튼, 드럼』 (1) | 2023.03.15 |
| 정지음 『언러키 스타트업』 (0) | 2023.02.14 |
![HONG[本]'s World](https://tistory4.daumcdn.net/tistory/113148/skinSetting/57a3aa977f5343919e1f6e0139d0b0ec)